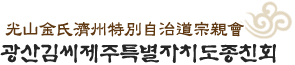|
|
| 족보,보첩용어,종류 |
홈 > 일반자료실 > 족보,보첩용어,종류 |
 | | | 우리나라 족보는 세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잘 발달된 족보로 정평이 나있으며, 계보학의 종주국으로 꼽힌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계보학 자료실에는 600여종에 13,000여권의 족보가 소장되어 있다. 보첩은 원래 중국의 6조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제왕연표(帝王年表:왕실의 계통)를 기술한 것이었으며, 개인적으로 보첩을 갖게 된 것은 한나라 때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제도를 설치하여 응시생의 내력과 그 선대의 업적등을 기록한 것이 시초가 된다. 특히 북송의 대 문장가인 3소-소순, 소식, 소철-에 의해서 편찬된 족보는 그 후 모든 족보편찬의 표본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의종(毅宗)때 김관의(金寬毅)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또한 사대부의 집에서는 가승(家乘)이 전해 내려왔는데 체계적으로 족보의 형태를 갖춘 것은 조선 성종7년(成宗7:1476)에 발간된 안동권씨 성화보 (安東權氏 成化譜)이고, 지금과 같이 혈족 전부를 망라한 족보는 조선 명종(明宗)때 편찬된 문화유씨보(文化柳氏譜)로 알려졌으며 지금까지 전해 온다. |
| | |  | | | | | 대동보(大同譜) | 같은 시조 아래에 각가 다른 계파와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을 함께 수록하여 만든 족보책이다. | | 족보(族譜), 종보(宗譜) | 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하였다. | | 세보(世譜), 세지(世誌) | 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록된 것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 | 파보(派譜), 지보(支譜) | 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 가고, 그 표제에 연안김씨파보, 경주이씨 좌랑공파보, 순창설씨 함경파세보 등과 같이 본관과 성씨 외에 지파의 중시조명 또는 집성촌, 세거지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에는 족보와 다름없다. | | 가승보(家承譜) | 본인을 중심으로 수록하되, 시조로 부터 자기 윗대와 아랫대에 이르기까지의 이름과 업적, 전설, 사적을 기록한 책으로 족보 편찬의 기본이 된다. | | 계보(系譜) |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 또는 한 부분만을 수록한 것이다. | | 가보(家譜)와 가첩(家牒) | 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킨다. | | 만성보(萬姓譜) |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국내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모아놓은 책으로 모든 족보의 사전구실을 하는 것이다.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簪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등이 있다. | | |
|
| | |  | | | | | 편찬 족보 명 | 편찬 년도 | 편찬자 | | 임인보 壬寅譜 | 1782 | 命獻.相五 | | 계사보 癸巳譜 | 1893 | 義範.裁洙 | 계사보 癸巳譜 이본 | 1893 | 虎相 | | 임술보 壬戌譜 | 1922 | 勝鉉 | | 임오보 壬午譜 | 1942 | 主務 錫翼(일명 創氏譜) | 한성대보 漢城大譜 | 1957 | 대종중 | | 정유보 丁酉譜 | 1957 | 문간공파 유사 昌鉉 | 기미보 己未譜 | 1979 | 제주도종친회장 黃洙 | 평장대보 平章大譜 | 2016 | 대종중 | | 전자족보 | 2020 | 대종중 | |
|
| | |  | | | "네(나)" 가 어느 파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편리하다. 조상이 어느 지역에 살았고 어떤 파가 살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씨족(氏族) 전체가 수록된 대동보(大同譜)를 찾아 확인하여야 한다. 족보(族譜)는 가로(橫)로 단을 갈라서 같은 세대(世代)에 속하는 혈손(血孫)을 같은 단(段)에 횡으로 배열하였으므로 자기 세대 의 단만 보면 된다. 만일 세수를 모르면 항렬자(行列子)를 헤아려야 한다. 흔히 파조(派祖)의 관작명(官爵名) 시호, 아호(雅號) 등을 따서 붙인 것임. 족보 계보도(系譜圖) 위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세계에는 대략 분파(分派) 계도를 그려놓고 무슨 파는 몇 권 몇 면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열(悅)을 기두(起頭)라 한다. 우측에 자전과 소(逍)는 열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표시한 것이다. 그 옆에 사첩(四疊)은 횡으로 네 번 바뀌었다는 뜻이 된다.
족보를 보면 序文(서문=머리말)이 나오는데, 이는 자랑스러운 가문과 조상의 숭고한 정신을 고취시키고 족보 간행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글이며, 족보의 이름은 OO譜(예를들어 庚午譜=경오보)라하여 족보 간행년도의 간지를 따 족보의 명칭으로 삼는다. 본문에는 始祖 (시조)와 鼻祖(비조)로부터 시작하여 가로 1칸을 같은 代(대)로 하여 보통 6칸으로 되어 있는데, 기록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름자가 나오고 字(자)와 號(호)가 있으면 기록한다. 이어서 출생과 사망연도가 표시된다.
20세 이전에 사망하면 夭折(요절)이란 뜻의 早夭(조요)라 표시하고 70세가 되기전에 사망하면 享年(향년), 70세가 넘어 사망하면 壽(수)라 하고 旁書欄(방서란)에 기록한다. 諡號(시호=사후 나라에서 내린 이름)와 官職(관직)이 있으면 기록되고 妃匹(비필)이라하여 배우자를 표시하는데 보통 配(배)자 만을 기록하며 배우자의 본관성씨와 그 아버지의 이름자와 관직이 기록된다. 또한 묘소가 기록되는데 소재지와 方位(방위) 그리고 石物(석물) 등을 표시하며, 합장 여부 등도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더러 出后, 出繼(출후, 출계)라 하는 것은 다른 집으로 養子(양자)를 간 경우이고, 양자로 들어온 사람은 繼子(계자) 또는 系子(계자)라 기록되며, 서얼(庶蘖)로 入嫡(입적)되었을 경우에는 承嫡(승적)이라고 표시한다.
옛날에는 女息(여식,딸)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하지 않고 대신 지아비의 성명을 원용하고 지아비의 본관성씨와 자식들의 이름만 족보에 올랐으나, 요즘들어 딸의 이름과 생년월일, 지아비, 자식들까지 올리는 족보가 많아졌다.
|
| | |  | | | | | 본관(本貫)
관향(貫鄕) |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와 혈족의 세거지(世居地) 로 동족(同族)의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하며,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씨(姓氏)의 종류(種類)가 적어서 일족일문 (一族一門)[같은 혈족의 집안(가족)]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성씨(姓氏)만으로는 동족 (同族)을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본관 (本貫)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성씨(姓氏): 나라에 큰 공(功)을 세워 공신(功臣)에 녹훈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귀화해 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 왕(王)이 본관(本貫)이나 성씨(姓氏), 이름을 하사(下賜) 했다고 한다. | 시 조
비 조
중시조 | 시조란 제일 처음의 선조로서 제일 첫번째 조상이며 비조란 시조 이전의 선계 조상 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다. 중시조란 시조 이하의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을, 모든 종중의 공론에 따라 정하여 추존한 사람이다. ◎비조(鼻祖):시조(始祖) 이전의 선계(先系) 조상 중 가장 높은 분을 말한다. ◎시조(始祖):초대(初代)의 선조 즉 첫 번째 조상(祖上)을 말한다. ◎중시조(中始祖):시조 이후에 쇠퇴하였던 가문을 중흥시킨 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전종문(全宗門)의 공론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며, 어느 자파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 선계와 세계 | 선계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란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체계를 말한다. | | 세와 대 | 시조를 1세로 하여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세라 하고, 자신을 빼고 아버지를 1대로 하여 올라가며 계산하는 것을 대라 한다.또한 자기의 조상을 몇 대조 할아버지라고 하고, 자신은 시조 또는 어느 조상으로부터 몇 세손 이라고 한다. | | 이름자 | 요즘은 이름을 하나로 부르지만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불렀는데,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을 아명, 우리가 익히 아는 자는 20세가 되면 요즘의 성년식과 같이 관례를 행하는데 여기에는 식을 주례하는 주례자가 있어 예식을 거행함과 함께 지어준 것이다. 또한 가문의 항렬자에 따라 족보에 오르는 항명과 특별히 따로 부르는 별호가 있다. 우리는 보통 윗어른의 이름자를 말 할 때 결례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살아계신 분에 대하여는 함자라 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는 휘자라 한다. | | 항렬과 항렬자 | 항렬이란 같은 혈족사이에 세계의 위치를 분명히 하기위한 문중 율법이며, 항렬자란 이름자 중에 한글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혈족 같은 세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돌림자라고도 한다. 선조들은 자손들의 항렬자와 배합법까지를 미리 정해 놓아 후손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관례로 만들어 놓았다. | | 후사와 양자 | 후사란 뒤를 잇는다는 뜻으로, 계대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만약 계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무후", 양자로 출계하였을 경우에는 "출후", 서얼로서 입적 되었을 경우에는 "승적", 그리고 후사가 확실치 않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후부전" 이라 칭한다. | | 墳墓 (분묘) | 산을 뒤로 업고 남쪽을 향하며 산의 줄기는좌로 청룡(靑龍)·우로는 백호(白虎)를 이루고, 앞에는 물이 흐르며 주산(主山)의 약간 높은 부위에 위치하고, 앞은 몇층의 단상을 이루면서 주위에 호석을 두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사대부의 무덤 주위에는 망주(무덤 앞에 세우는 한상의 돌기둥)를 세우고 석인(돌로 만든 사람의 형상)을 배치하였으며, 분묘 앞에는 상석(제물을 놓기 위하여 돌로 만든 상)과 묘표(墓標)를 두고 신도비(神道碑)또는 묘비(墓碑), 묘갈(墓碣)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성행했으나, 조선시대에는 유교로 말미암아 중을 제외하고 토장을 하여 분묘가 많이 발달하였다. | | 묘소(墓所) | 묘소란 분묘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 족보에는 "묘(墓)"자 만을 기록하고, 좌향[(坐向:묘가 위치한 방향:방위(方位)]과 석물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 합장의 여부등도 기록한다. [합봉, 합묘]는 두 부부를 한 봉분으로 합장했다는 말이고, 쌍봉은 같은 묘소에 약간 거리를 두고 두 봉분을 나란히 만들었다는 것이다. | | 묘계(墓界) | 묘계는 무덤의 구역으로 품계에 따라 무덤을 중심으로 1품은 사방 100보, 2품은 90보, 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50보, 생원, 진사는 40보 그리고 서민은사방 10보로 제한하였다. | | 묘포(墓表) | 표석이라고도 하며 죽은 사람의 관직 이름과 호를 앞면에 새기고, 뒷면에는 사적(事績) 또는 비석을 세운 날짜와 비석을 자손들의 이름을 새겨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이다 | | 묘지(墓誌) | 지석(誌石)이라고도 하며, 천재지변 또는 풍우(風雨)나 우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묘를 일어버리느 것에 대비해, 금속판이나, 돌, 도판에 죽은 사람의 원적(原籍)과 성명(姓名), 본관, 원적, 성행(性行, 경력등의 사적을 서술한 것이다. | 묘비(墓碑)와
비명(碑銘) |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의 총칭이며, 비명이란 비에 생긴 글로서 명문, 비문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고인의 성명, 본관, 원적, 성행, 경력등의 사적을 서술한 것이다. | | 신도비(神道碑) | 임금이나 고관의 무덤 앞 또는 길목에 세워 죽은 이의 사적을 기리는 비석이다. 대개 무덤 동남쪽에 위치하며 남쪽을 향하여 세우는데, 신도라는 말을 사자의 묘로 즉 신령의 길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3품이상의 관직자의 묘에 세운 것으로 보이나 현존하는 것은 없으며, 조선시대에 와서 2품이상의 관리들에게 세우는 것을 제도화 하였다. 왕의 신도비로서는 건원릉의 태조 신도비와 홍릉의 세종대왕 신도비가 있으며, 문종은 왕릉에 신도비를 세우는 것을 금지하여 그 이후에는 왕이 신도비는 세우지 않았다. | | 묘갈(墓碣) | 신도비와 비슷하나 3품 이하의 관리들 무덤 앞에 세우는 머리부분이 동그스름한 작은 돌비석으로 신도비에 비해 그 체재와 규모가 작고 빈약하다. | | 諱(휘) | 돌아가신분의 이름앞에 붙여 존칭함. 살아계신분의 이름을 물을 때 '함자(銜字)'라 한다면, 돌아가신분을 물을 때는 '휘자(諱字)'라 함. | | 字(자) | 본명이외에 부르는 이름 | | 號(호) | 본명이나 字이외에 쓰는 아명(雅名), 또는 세상에 널리 드러난 이름 | | 諡號(시호) | 임금이나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의 공덕을 기리어 죽은뒤에 주던 이름 | | 乾位(건위) | 죽은 남자의 무덤이나 신주. 주로 남편의 묘소를 지칭할 때 사용 | | 坤位(곤위) | 죽은 여자의 무덤이나 신주. | | 考位(고위) | 돌아가신 아버지와 각 代 할아버지의 位. 반대는 비위 | | 先考(선고) |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는 '선비' | | 先塋(선영) | =선산(先山)=선묘(先墓). 조상의 묘소가 있는 곳. | | 官爵(관작) | 관직과 작위. 벼슬 이름 | | 配位(배위) | 부부가 다 돌아가신 경우 그 아내를 높이는 말 | | 雅號(아호) | 문인,학자,화가등이 본명외에 따로 지어 부르는 이름 |
|
|
|